
이 작품은 개화世代, 식민지 세대 등 2代의 짓밟힌 민중의 이야기를 묘사한다.
월례의 엄마는 풍각쟁이 성구와 결혼해 살다 남편은 온다 간다 말없이 떠나고 월례를 낳고 그후 양반 종가집에 하녀로 일하다가 임신한 것이 들어나 동네사람들의 문초 끝에 아무 얘기 못하고 맞고 그 죄로 외딴 곳에 갇힌다. 그러나 그 씨는 종가집 큰 자제와의 불륜으로 그 죄를 본인이 안고 물에 투신한다. 월례만 달랑 남겨 두고… 시간을 10여년 흘러 월례가 17살 때. 동네 씨름장사인 덕보가 씨름판에서 장원을 하고 월례와 결혼하겠단다. 덕보 어미는 그애 어미의 과거를 알고 덕보를 달래보나 막무가내이다.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킨다. 그리고 흥겨운 혼례 한 마당. 아들도 낳고 때마다 씨름대회만 열리면 따논 당상이지만 요즘은 일본군과 의병대의 싸움이 잦아 뜸하다. 그래도 군 씨름대회에서 장원을 해 젖소새끼를 상금으로 받고 어찌할 꿈에 부부는 부풀어 있다. 드디어 군 씨름대회가 열리고 덕보는 역시 장원을 한다. 그리고 뒤풀이 때 술 거나하게 먹고 집에 갈 때, 탈을 쓴 의병대에 끌려 산채로 간다. 거기에서 버티다 버티다 결국 가담할 수 밖에는 살 방법이 없다. 의병장 왈 “지금은 천지가 암흑이다. 네놈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어!” 월례는 남편을 기다리기 하세월. 가난아이 달득이 청년이 될 동안 애비한테선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별도 없다. 어느 날 달득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서며 만주 어딘가에 아버지다 있다고 해서 찾아나선단다. 월례는 남편에 자식까지 내보내고는 털썩 주저앉는다. 그러나 그날반, 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월례 집으로 몰려와 달득이가 양반 종가집에 불을 놓고 도망쳤다며 이집에 불을 놓고 월례를 초가집 채 불질러 버린다. 남편 잃고 자식마저 떠난 한 많은 여인네의 처절한 최후인 것이다.

너덜강이란? : 돌이 많이 흩어져 덮인 비탈을 이르며 천한 신분이나 패역자 혹은 동구 안에 못 들어올 사연을 지닌 시신을 이곳에 묻는 풍습이 三南에 전해 내려옴.
<너덜강 돌무덤>은 독특한 소재와 흥미로운 사건으로 해서 신선감을 주지만 역시 구성상의 산만성이 결함이었다. 서민의 삶과 죽음을 근대사의 격동 속에 투입해서 그 생존양상을 조명해본 것은 좋은 착안이었고 막과 장 사이사이에 토속적인 창이며 풍물, 굿거리, 상여소리, 씨름판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널려 있어 재미있고, 3, 40년의 흐름이 휙 지나감으로 지루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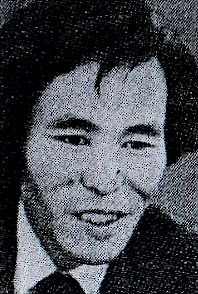
박환용 : 1953: 全北 南原 출생.
圓光大學校 國語國文學科 졸업. 同大學院修了. 西海工大 강사. 現在群山大學 재직.
1980~1983 전북 아동문학회 회원 「원형무대」 동인 예술동인회 「사린교」 회원
작가의 글 <너덜강 돌무덤>을 쓰고 나서
지난 십수 년간을 나는 문학을 짝사랑하면서 그 언저리를 맴돌아 왔다. 시나 소설, 아동문학이나 평론 그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문학은 늘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결국엔 내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유독 「희곡」만은 껄끄러운 거리감을 지닌 채 저 만큼 서 있었다. 내게 일찍이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의 교과서적 고전 속에서 서구적 제스처의 과장된 몸짓과 이국적 치장으로나 어렴풋 만져질 뿐인 잘 포장된 외제 물건같은 것으로나 느껴졌던 것이었다. 더구나 허다한 이 나라 연극의 그 어색한 서양 냄새는 나의 이런 선입견을 더욱 경직되게 몰고 갔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 문학으로서의 희곡이 기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모양과 빛깔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조금은 외롭게 모색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희곡에 대한 나의 짝사랑은 여전히 그저 암중모색으로 남아, 나의 어두운 골방에서나 꿈꾸어 보던 그런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가리워진 지난 수년간의 암중모색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인 한, 무대에 올려질 이야기 역시 뿌리 없는 외래의 것이 아닌 우리 이야기, 우리의 삶을 담은 것이어야 하리라는 확신을 지녔던 것이다. 그 확신 끝에 나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무수하게 널려 있으나 주목되지 않았던 우리 先代, 그 아프게 앓았던 한스러운 사연의 편린 한 조각을 옮겨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낙선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이런 자신 없음은 자칫 「희곡」에 접근하려 하는 내 방식에 대한 의혹과 좌절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 뿔에 든 것이, 우선 이런 면에서 나는 기쁘고 소중스럽다. 소극장 하나 없는 한촌에서 희곡을 어수룩하게 사랑한 문학도에게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삼성미술문화재단에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신 지도교수 박항식 선생님과 박순호 선생님, 모교의 은사님들과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群山大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윤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2) | 2023.12.05 |
|---|---|
| 이근삼 '멀어지는 기적' (2) | 2023.12.05 |
| 장소현 '춘향이 없는 춘향전, 사또' (2) | 2023.12.03 |
| 정복근 '산넘어 고개넘어' (2) | 2023.12.03 |
| 전진호 '밤에만 날으는 새' (1)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