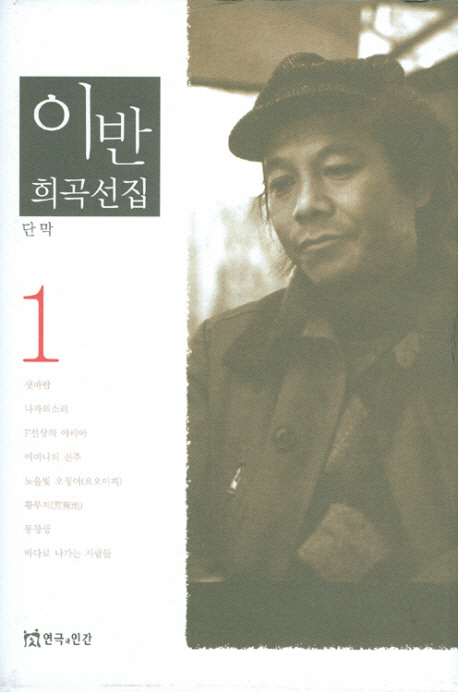
<동창생>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단막극이다. 월남 청년 박성일은 야간열차 안에서 소란을 부리다 헌병에게 붙잡힌다. “답답한 기차 칸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래를 불렀다는 성일의 항변, “바람 찬 흥남부두”(‘굳세어라 금순아’)를 노래하자 불순분자라고 끌려가는 것, 군에 입대했으나 도로 나왔다는 말에 돈이나 빽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 불순분자를 쉽게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사태 등은 극의 배경인 1950년대 혹은 극을 창작한 당대를 풍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극의 중심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알레고리에 있지 않다. 박성일이 이런 해프닝에서 구출되는 것은 헌병 하사 안정호 덕분이다. 안정호는 성일의 나이가 22세에 본적이 함경남도 흥원군이고 흥원 제2인민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흥원 제1인민학교 동기동창으로 몰아버린다. 그리곤 그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관심으로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된다. 성일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성일의 어려운 처지를 적극 도와 그와 그의 누이동생을 취직시키며 정성껏 돌보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성일은 진실을 속인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성일을 동창생으로 몬 장본인은 바로 정호였다. 여기에서 정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타지에서 만난 친구에게 투영한다. 그에게 ‘동창생’ 성일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대체하는 매개물 이되, 그것은 ‘환상’ 속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때 그 ‘환상’이 현실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 그것으로 인해 극중인물이 현실을 견디게 되거니와 그것은 현실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만남의 의미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헤어진 가족, 친구, 그들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한 맺힌 절규이다. 안정호의 마지막 대사는 독자로 하여금 분단의 문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데 충분하다.
유숙 : 성일씬 당신과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고 앞으로 그 끈을 끊을 수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실은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호 : 우리의 끈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 그러면 되었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해
유숙 : 사실은, 동기동창이... .
정호 : 사실이나 진실이 우리 세대에게 준 게 뭐가 있어? 내게 준 게 무엇이 있어? 나도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내게 단 한 명의 가족도 친구도 갖다 주지 않았어. 이 넓은 땅에 내게는 단 한 명의 피붙이도 없어. 근에 이제 와서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명의 동기동창생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야? 성일인 내 동기동창이야. 이남 땅엔 내게 동창이 하나 있어.
유숙 :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호 : 성일인 내 동창생이야. 그것도 초등학교 때... .
‘동창생’은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만이 진정한 뜻을 아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서,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가 있으면 동향인이며, 친척이고 싶은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작가 이반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남으로 피난 나온 피난민이다. 그리고 지금도 피난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다. ‘동창생’은 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보기 위해 쓴 작품이다."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유정 '사막' (1) | 2015.10.28 |
|---|---|
| 백하룡 '선유도' (1) | 2015.10.28 |
| 신원선 '하나님은 릴리스를 살해했다' (1) | 2015.10.27 |
| 조원석 '컴퓨터 결혼' (1) | 2015.10.27 |
| 장일홍 '내 생애 단 한 번의 사랑' (1) | 201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