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작가 박조열의 「흰둥이의 방문」은 유신시대인 1970년 초에 집필됐다. 유신정권에 가로막힌 민중의 ‘소리’를 담은 이 희곡에 대해 박조열 작가는 ‘단순한 기담(奇談)이 아닌 사회적 우화’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우화가 41년 만인 2011년 무대에 올랐다. 유신시대를 빗댄 이 ‘사회적 우화’는 2011년 대한민국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어떤 ‘소리’를 낸다.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사, 행위의 간격과 호흡은 유머러스하고 가볍다. 무대는 관객이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동참할 때 즐길 수 있는 블랙 조크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에 반해 그들의 대화와 행위가 담고 있는 바는 꽤 묵직해 블랙코미디의 미학을 제대로 역설한다.

무대는 블라인드를 스크린 삼아 재생되는 TV 화면과 기다란 침대 하나로 간소하게 차려지고 의상 역시 평범하며 스토리도 간단하다. 주목해야 할 거라곤 블라인드에 비치는 TV 영상과 인물의 행위, 오가는 대사뿐이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람의 말을 하는 개’ 흰둥이로 이뤄진 세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방관자와 생각 없는 실행자 그리고 ‘개소리’를 내는 자로 대표된다. 아내는 남편에게도, 흰둥이에게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TV 채널을 바꿔가며 화면만 바라본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내와 흰둥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흰둥이는 개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한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줄 알면서도 말이 아닌 ‘개소리’를 내는 흰둥이는 분명 ‘사람’이면서 ‘개’다. 그는 자신들이 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게 됐는지 설명하고 남편 역시 그 울음소리를 따라하며 눈물을 터뜨리지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한다. 이 ‘생각 없는 실행자’는 데모 진압 현장으로 나오라는 전화가 오자마자 또 다시 바로 옷을 갖춰 입고 출동한다.
데모 진압 영상이 다시 TV 화면에 나온다. 경찰버스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물대포가 분사된다. 2011년의 대한민국을 담고 있는 이 영상 속 시위대를 보며 아내는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경찰인 남편은 그 오랜 시간 흰둥이와 대화를 나눴지만 출동 명령을 받자마자 ‘개’들을 진압하러 나간다.

남편과 흰둥이가 반대편에서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 중앙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는 오르가즘을 느낀다. 많은 뉴스 프로그램이 시위대와 진압대의 자극적인 대치화면을 방송하지만, 희한하게도 시위대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개소리’를 내고 있다.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개소리’. 시위대의 목소리는 어째서, 언제부터 ‘개소리’가 됐을까. 이 체제 비판적인 도발적 단어 ‘개소리’가 담고 있는 풍자를 1970년에서 2011년으로 소환한 주체는 그들의 발언대를 빼앗은 정권만이 아니다.
흰둥이는 말했다. ‘생각하길 싫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희곡 「흰둥이의 방문」이 집필된 지 41년이 지난 지금 ‘그 좋지 않은 일’은 더 만연해졌다. 정권에게도, 대중에게도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개소리’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개소리’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어느 날 남편, 아내가 있는 한 가정에 갑자기 방문한 개. 개는 음식과 커피를 얻어먹으며 부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껏 하고 집을 떠난다. 경찰인 남편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다” 매우 간단한 에피소드를 담은 박조열 작<흰둥이의 방문>은 함축적이고, 힘 있는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시대의 단면을 단막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셋의 관계를 “권력”과 “파워게임”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 남편, 부인, 개. 이렇듯 셋의 관계 속에서 진정 누가 누구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포착한다. 이로써 단막극은 단지 어두웠던 특정 시대의 묘사가 아닌 ‘현재’ 사회 파워게임 속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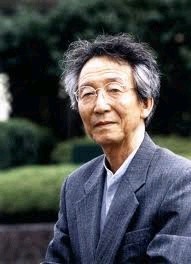
작가 박조열
· 함경남도 함주군 하조양면 기회리에서 출생(1930. 10.)
· 함흥고급중학교 졸업(1948)
· 북한에서 중학교 문학 교원(1949)
· 한국전쟁 중 월남. 이후 12년간 육군 복무
·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연구과정에 입학하면서 극작 시작(희곡·방송극)(1963). 이후 현재까지 전업 극작가.
· 여석기 교수와 함께<한국 극작 워크숍>개설(1973)
· 「오장군의 발톱」, ‘공연 불가’ 판정받아 14년간 공연 금지(1975)
· 1986년 이후 희곡 창작 중단.
· 1986년부터 연극에 대한 ‘사전 규제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주도.
· 한국연극협회 · ITI한국본부 초대 극작분과위원장
· 숭의여자대학 한양대학교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겸임 교수 역임.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동아연극상(「토끼와 포수」, 1965)
대한민국 방송대상(「땅의 아들들」, 1981)
백상예술대상(「오장군의 발톱」, 1988)
카이로국제실험극연극제 공로상(2000)
문화훈장 옥관장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명화 '봄에 눈이 와요' (1) | 2015.11.13 |
|---|---|
| 하유상 '미친 여자와 유령의 남자' (1) | 2015.11.13 |
| 신명순 '신생공화국' (1) | 2015.11.12 |
| 김의경 '남한산성' (1) | 2015.11.12 |
| 이만희 '베이비시터' (1) | 201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