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 년 전 '원'이 '고려'를 침탈하던 때, 한 겨울 밤,
백두산 밑의 어느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비와 닮지 않았다.
아비와 할아비와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를 겨울 산에다 내다 버리기로 결정한다.
"아비와 닮지 않은 아이는, 그런 이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가 수치요 죄악이다.
그러니 아이를 버려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아이는 사라진다. 차마 아이를 겨울 산 속에 버릴 수가 없었던 어미는
아이를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 다시 어미의 배 속으로 되돌리기 위해,
아이를 무쇠 솥에 넣고 삶아서 먹어버린다. 그리고 어미는 임신을 한다.
열 달 후, 무엇이 태어난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다. 총알이다.
단단한, 그래서 죽지도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총알이는 군인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전쟁에 나선다.
대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월남전쟁...
그리고 어느 날 내 아파트 냉장고 속에서 나타나 나에게 묻는다.
"내가 누구냐?"

미생자(未生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작가의 상상력의 세계에서 탄생한 총알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태어나지 말아야할 운명과 같은 현실을 받아들인다. 총알이의 폭력적인 행동과 각주자의 대사들은 관객들에게 웃음 뒤에 느낄 수 있는 씁쓸함을 주게 된다. <미생자>에서는 등장하는 배우, 각주자는 의자에 앉거나 서거나 걸터 앉거나 눕거나, 모두 나와 있다. 각주자는 모두 구경꾼이다. 각주자는 설명하는 사람 즉 나 같은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또는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실 누구나가 다 각주자가 될 수 있다. 각주자가 말하는 대사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다. 우리 인식의 그림자, 틈새 감추어진 부분, 증오와 폭력이 인간역사 과정에 숨어버린 존재, 배재되어버린 인간성, 아직 오지 않은 인간, 그리움, 절망의 씨앗 속에 자라는 배아, 거짓 속에 태어난 사람, 거짓 속에 비록 탄생했지만 나는 엄연히 탄생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속에 존재하지만 진실 속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화두와 같은 질문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전쟁이라는 심각성을 관객으로 하여금 반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도된 작품이며 꿈에서 본 듯한 또는 후천개벽의 예감이나 인류의 예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파트의 이야기에서 냉장고 속 총알 할아버지의 자살이 과거로 여행의 시작이며 총알이의 탄생 배경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 옛날 부부의 이야기에서 서로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의 벽은 날로 쌓여져 폭력성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모든 불신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며, 총알이가 이의 산물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서로 얽혀져 반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우리 인식의 그림자, 틈새 감추어진 부분, 증오와 폭력이 인간역사 과정에 숨어버린 존재, 배재되어버린 인간성, 아직 오지 않은 인간, 그리움, 절망의 씨앗 속에 자라는 배아, 거짓속에 태어난 사람, 거짓 속에 비록 탄생했지만 나는 엄연히 탄생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지구 부적응자의 변 - 작가 윤영선
언어라는 말(馬)을 타고 길을 간다. 익숙한 말을 타고 익숙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가 본래적으로 주어졌고 순결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말(馬)처럼 말(言語)도 질병에 걸렸고 오염되었고 눈이 멀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가는 익숙한 길이란 사실 길이 아닌게 아닐까?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길이라고 부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길이 아니고 죽자살자 아니면 무심한 듯 어벙하게 그 길을 벗어나 덤불과 숲으로 뒤덮인 거기 들어갔다가는 짐승이나 독사한테 물려서 즉사할지도 모를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듣고 경험하고 책을 보고 배우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회의 또는 부정의 정신 속에서 암중모색하고 깨지면서, 그 아닌 것 속에서 세상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언어와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작용마저도 부정하면서 또 태어나면서 또 부정하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수풀을 헤치고 나가면서 여기가 길인 것 같은 뎁쇼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길이 아닌 것도 같은 뎁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도 길인 뎁쇼라고 말하는 뭐 이런 골때리게 웃기고 황당하고 진지하고 터무니 없고 눈물나는 뭐 그런거 아닌가?
<미생> 연습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 재미있었다. 이상우 연출의 다다다다 치고 들어가는 언어와 몸짓의 속도는 불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언어에 대한 공격, 그 불신의 틈을 채우고 채우고 죽음의 흔적과 냄새마저도 지워버리는 지워버리려는 폭포처럼 쏟아져내린 김수영의 산문시 같았다. 이상우 연출은 진정한 의미의 침묵을 알고 있기에 그러는 걸까? 그 침묵을 통해서 다다다다하는 음악을 만드는걸까? 아니면 다다다다 하는 음악을 통해 침묵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 음악성과 침묵은 삶의 등가적인 양면일까 비애일까 죽음의 극복일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판의 해원굿일까? 그만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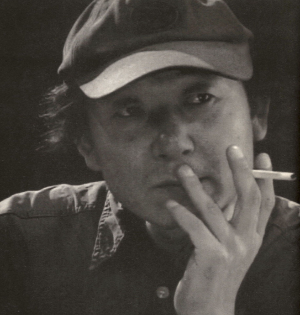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은영 '사일런스' (스티그마) (2) | 2025.02.03 |
|---|---|
| 전경화 '밥풀' (1) | 2025.02.02 |
| 김희진 '봉천동 카우보이' (2) | 2025.02.01 |
| 오지윤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 ' (2) | 2025.02.01 |
| 김성진 '안녕, 오리!' (2)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