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규는 한 예술가의 생애를 사건 중심으로 보지 않고, 예술창조의 치열한 내적 추구의 과정으로 보아서 그의 외적인 삶을 내재화시킨다. 말하자면 그는 그가 시도해 나오던 전통극의 현대적 수용을 외형적인 것에서 내면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허규의 <광대가>는 그가 끈질기게 시도해 나온 전통극의 외형적인 수용을 예술의지라는 한 예술가의 내면세계로 옮겨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창극의 신파성을 배제시킨 가운데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내려는 신재효라는 예술가적 개성을 뚜렷이 표출시킨 허규라는 작가의지가 <광대가>라는 창작 형식을 넘어서서 예술로서 우리를 매료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창극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예술화 한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날카로운 주제의식과 예술의지만 살려낸다면 우리의 전통예술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현대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커다란 충격일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한 것이 <광대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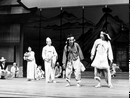
각설이가 등장하여 관객과 한판 놀이를 벌이는 가운데 신재효와 공연에 대한 암시를 준다. 초란이, 각설이 등이 신재효가 재인을 청에 거두어 준다는 사실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신재효에게 재주를 선보이려고 줄을 선 가운데 여러 사람의 재주자랑이 이어진다. 여러 패의 재주자랑이 한동안 이어지고, 진채선이 남장으로 노래를 부르다 여자임이 들통난다. 그 재주에 감탄한 신재효는 그녀의 교육을 김세중에게 부탁한다. 여류명창이 되고자 특훈하는 진채선. 신재효는 김세중에게 채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명창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이때 들이닥친 화적떼들에게도 신재효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대한다. 신재효 부인이 집안 체면을 생각할 것을 당부하지만, 신재효는 채선에게 경복궁 낙성관에 올라가야 하니 분골쇄신 공부하도록 이른다. 채선을 경복궁에 가객으로 보내는 환송연이 벌어진다. 김세중이 신재효가 지어준 ‘채선’이라는 이름의 풀이를 한다. 초란의 선창으로 이별가를 합창하고 채선이 한양으로 떠난다. 경복궁 중건 축하연이 벌어진다. 대원군은 문초를 당하고 있는 채선을 대령하라 이르고 채선은 여장으로 김세중과 대령하여 춘향가를 부른다. 채선은 대원군의 큰 칭찬에 감격의 순간을 누린다. 세월이 흘러 신재효는 연로했고 와병중이다. 이때 궁중전령이 그에게 통장대부 절충장군의 칭호를 내린다. 이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채선이 들어와 만남의 반가움을 노래하니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고 신재효가 <심보가>를 지어 부르니 모든 사람들이 힘차게 후렴을 받는다.


작가 허규의 글
전북 고창읍 하긍리에 통정대부신공재효유애비(通政大夫申公在孝遺愛碑)란 비석이 있다. 신재효란 분은 조선왕조말(1812년 ~ 1884년)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고 광대들을 교도하여 수많은 명창들을 배출하는 데 온 생애를 바친 이로서 우리 나라 고유의 음악극인 판소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번 국립창극단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 <광대가>(廣大歌)는 그의 생애를 창극화 한 작품이다. 그가 지은 판소리 사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토별가, 변강쇠가는 전래해 오는 광대들의 사설을 정리했다기보다는 극본이라 할 만큼 극작이 잘 되어 있으며 특히 그가 지은 가사들 가운데 광대가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극작론이며 연출론이며 배우론이라 할 수 있고, 판소리의 정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광대가 중 일부분을 소개하면 “광대행세 어렵고 또 어렵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직차 득음이요, 그직차 너름새로. 너름새(연출법과 연기술)라 하는 것이 구성지고 맵시 있고, 경각에 천태만상, 위선위귀 천변만화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노소남녀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 구성 이 맵시가 어찌 아니 어려우리. 득음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률을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 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옥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미부인이 병풍 뒤에 나서는 듯 삼오야 밝은 달이 구름 밖에 나오는 듯 새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속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이 가사는 광대가의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렇듯 음악·문학·연극·이론에 천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창극 <광대가>는 신재효의 말년의 생애를 극화한 것인데, 특히 그의 업적 중 천대받던 많은 재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판소리의 여명창 진채선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그렸으며, 그의 호쾌하고 파격적인 인간상을 부각시키면서 민족 가무극의 무대예술 양식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 의도였다. … ‘광대’(廣大)란 창우(倡優), 창부(倡夫), 가객(歌客), 삼패, 재인(才人), 당골, 탈놀이꾼, 초란이패, 꼭두패 등 우리 나라에 전래해온 직업적 연희자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처럼 알기 쉽지만 실은 이들 가운데서도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을 ‘광대’라 이름붙여 주었으며, 그 수준에 따라 대광(大廣), 소광(小廣), 또랑광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 것이니, 앞에 옮겨 놓은 <광대가>는 당시의 수준 높은 판소리의 예술 형태론이며, 예술 교육론이며, 또한 판소리 연희의 이상적 실기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만큼 판소리에서 고수의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듯한데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있었다면 금상첨화격으로 판소리 예술을 이해하는 데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어떻든 이 기회를 통해서 ‘광대’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정당한 가치 부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소정 '집의 생존자들' (1) | 2023.01.26 |
|---|---|
| 조정일 '기억할 만한 지나침' (1) | 2023.01.25 |
| 조정일 '제비' (1) | 2023.01.24 |
| 유희경 '아버지의 나라' (1) | 2023.01.24 |
| 박춘근 '이제 네가 나를 보살필 때' (1)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