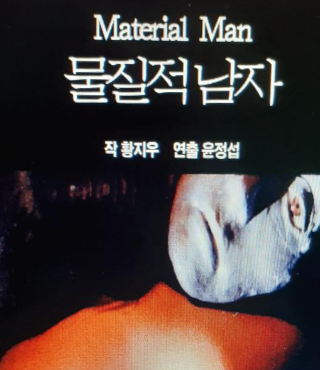
주인공은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지하에 갇힌 한 남자이다. 남자는 8년째 구조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꺼져가는 목숨의 끈을 붙잡고 있다. 남자의 몸은 인형으로 표현되고, 마음은 배우가 대사로 연기한다. 분 명 누구나 겪어야 할 순간이지만 망각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 맞닿은 시점을 극대화해 보여주는 듯하다. “아아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비 그친 먼 들녘 한 가운데 혼자 서 있는 떡갈나무…그 밑에 가서/뒤늦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내 볼에 맞고 싶어!/(중략)/비릿한 바람 속에서 숨 한 번 쉬어봤으면!”
바깥세계에서 그는 40대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에게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권태를 느끼면서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과 교제를 한다. 소녀와 관계를 가질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감을 맛본다. 사고가 있던 날도 그는 소녀의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그런데 소녀의 선물을 사고 나오는데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어울릴 것 같은 보라색 블라우스를 샀다. 그리고 그 순간 백화점은 무너졌다. 지하 속, 그는 8년 지난 지금도 그 블라우스를 손에 들고 있다.
연극은 이러한 이야기 구조 속에 인간의 몸, 영혼의 구제, 재앙 등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를 던진다. “우리는 거대한 세트장 같은 도시에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앙과 죽음의 위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무대는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경사진 공간과 그 주위를 빙 둘러싼 평면 무대로 꾸며지는데 각각 남자가 매몰된 지하공간과 현실세계(또는 남자의 기억 속의 세계)를 의미한다.


삼풍현장에 '마음없는' 사나이가…"문자에 대한 외면…복수당할 겁니다" 모든 가벼운것의 종말에 대한 예언 "복수 당할 겁니다."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가벼운 것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그는 문자가 크고 넓은 힘을 가졌을 때 문자로 집을 짓는 시인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희곡을 썼다. 이제 문자의 깊은 울림은 좀더 화려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들 아래 묻혀지는 듯하다. "천박해 지겠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문자에서 고개를 돌린 데 대한 보복입니다."
황지우씨가 월간 '현대문학' 8월호에 두 번째 희곡 '물질적 남자'를 발표했다. 3년 만이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붕괴 현장의 지하공간에 8년 째 갇혀 있는 한 사나이의 '몸'과 '마음'이 이야기의 큰 기둥이 되었다.
"작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친구의 사무실을 찾아가다가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문득 이곳에 누군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는 "내가 생각해도 잔인한 발상"이라면서 웃었다. 희곡에서 사나이의 몸은 인형이, 마음은 인형조종자가 연기한다. 인형은 사람의 모양을 갖췄으되 마음은 빠져있는 것이다.

'물질적 인간'의 다른 이름이다. 남자의 몸인 인형이 갇힌 곳은 세상 모든 물질이 집합했던 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다. 이런 목소리가 집합한 곳이기도 하다. "(보상금이) 오천육백만원이 뭐야? 지난번 KAL기 사건 때도 1억2,000만원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해!" "그놈의 10부제 땜에 등교 때 카풀을 부탁드렸더니 그래, 니네 그 자알난 아저씨가아, 내 저년을 어떡하냐, 꿀꺽 삼키셨단다!" "나는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40대의 전형처럼 되어갔죠.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려고 밖에서 일을 만들고…"
시와 희곡은 말하자면 얼음과 물 같은 것이다. 작고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 흐른다. 단단한 언어의 농축물인 시를 녹이면 잡다하고 범속한 삶이 흘러내린다. 흐르는 삶을 글로 옮긴 것이 희곡이다.
시는 언어를 베어냄으로써 만들어진다. 희곡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을 전제로 한다. 두 장르 모두 스스로 몸을 가둔다는 데서 같은 숙명을 갖는다. "셰익스피어가, 브레히트가 시에서 희곡으로 옮아갔다."
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부임한 지 6년 째다. 시는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40대 즈음에 시를 쓴다는 건 40대에 수음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는 아주 젊었을 적에, 또 한참 나이를 먹고 나서 쓰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이제 '정말 잘 쓴 시'라고 할 만한 시를 쓰고 싶어요. 나이 든 뒤에."
"문학이 쓸쓸하다"는 그의 말이 "활자가 쓸쓸하다"는 말로 번진다. 활자로 된 모든 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해 그는 자신의 발걸음으로 답한다. 그는 시인이자 극작가다. 다른 빛깔의 옷을 입되 등에 짊어진 것은 변함없이 오랜 시간의 무게가 얹혀진 문자이다. 그 무게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광탁 '누이야 큰 방 살자' (1) | 2018.03.18 |
|---|---|
| 오효진 '사주 팔자 고칩니다' (1) | 2018.03.18 |
| 김덕수 '강변풍경, 가을 - 나무의 日記' (1) | 2018.03.18 |
| 방영웅 '분례기' (1) | 2018.03.18 |
| 김광탁 '꿈꾸는 연습' (1) | 2018.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