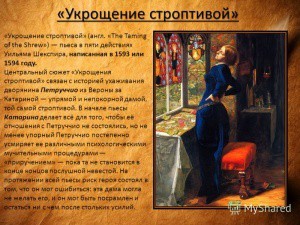
〈시베리아의 도사(Siberian Shaman)〉는 1786년에 쓰여진 러시아의 계몽 군주 에카테리나 여제의 작품이다. 에카테리나 여제는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서간, 에세이, 회고록 등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을 썼던 여류 작가이기도 했다. 무대 예술과 관련하여서는. 그녀는 24편이 넘는 희곡과 오페레타들을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로 썼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궁전에서 실제로 공연되었을 뿐 아니라 가끔씩 외부의 극장에서 대중을 위해 공연되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 자신의 글쓰기 활동에 대해서, 에카테리나 여제는 그것을 하나의 재미삼아 하는 활동이라고 스스로 애써 폄하하여 말했지만 그녀의 글들 속에는 러시아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고자 했던 자신의 야심만만한 정치적 사회적 철학이 표현되고 있었다.
사실, 에카테리나 여제는 "연극은 국가의 학교이다… 나는 그 학교의 우두머리 선생이다.” 라고 까지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연극의 계몽적 기능에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 그녀의 작품들 속에는 무지와 미신, 외국문화 숭배, 진보에 대한 두려움 등 당시의 러시아 사회가 가졌던 후진성을 몰아내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은 사고방식의 경직화를 초래하기도 한 듯하다. 서구적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녀의 의도는 〈시베리아의 도사〉 속에서 암반 라이가 보이는 신비주의적 지혜를 애써 허황된 것으로 무시하고 어거지식으로 그를 악당으로 몰고 가버리는 극적 취약점을 초래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시베리아의 도사인 암반 라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다가 그의 처방대로 보빈과 보비나 부부의 딸 프렐레스타가 첫사랑의 청혼자인 이반 페르나토프와 결혼하게 되는 희극이다.

작가소개
에카테리나 여제는(1729~1796)는 러시아인이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러시아 황실의 사람도 아니었다. 예카테리나란 이름은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면서 얻은 세례명이고 원래의 이름은 소피 프리데리케 오귀스트로 프로이센과 스웨덴의 접경지인 안할트체르프스트 공국이라는 작은 공국의 공녀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 환경과 신분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소피는 러시아 제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소피는 독실한 프로테스탄트교 신자이며 성실하기만 한 아버지 밑에서 작은 공국의 공녀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다만 러시아 황실과 먼 친척 관계였던 그녀의 어머니 요한나가 야심 없는 남편에 답답해하며 소피를 이용하여 권력을 얻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소피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자애와 어울리기보다는 남자애들과 어울리며 말을 타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바느질보다는 책을 사랑했던 소피는 어머니의 극성 속에서 막연히 황제나 황후라는 말이 주는 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타 여제가 통치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제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이을 황제로 카를 울리히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치세에 후사를 보겠다는 욕심으로 카를 울리히의 결혼을 서둘렀다. 러시아 황실과 왕권의 안정을 꾀하던 엘리자베타 여왕은 정치적으로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가문에서 황태자를 간택하기를 희망했다. 그결과 선택된 것이 소피 프리데리케 오귀스트였다. 소피는 14세에 러시아로 가서 예카테리나란 세례명을 받고 16살에 훗날 표트르3세가 되는 카를 울리히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 결혼은 완전히 실패였다. 표트르는 예카테리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예카테리나 또한 표트르에게 애정을 가질 수 없었다. 명목상 황태자와 황태자비인 채로 두 사람은 각자 정부를 가지고 18년간을 함께 살았다. 예카테리나가 낳은 세 아이들도 모두 정부의 소생으로 아버지가 각각 달랐다. 엘리자베타 여제도 이 사실은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러시아 황권의 안정을 위한 후사일 뿐, 누구의 혈통이냐는 어차피 관심거리 밖이었다. 예카테리나의 남편 표트르는 황제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의 황태자인 스스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자란 프로이센에 대한 해바라기 사랑으로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프로이센인인 예카테리나가 더 러시아를 사랑하였다. 그녀는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배웠으며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였고 러시아 역사에 통달하였다. 더불어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과 교유하면서 러시아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황태자의 인기를 땅에 떨어지고 황태자 비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열광적이 되었다. 여제 엘리자베타가 죽고 표트르 3세가 즉위하였을 때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전쟁 중이었다. 표트르 3세는 즉시 러시아가 불리한 조건으로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황실에 프로이센 세력을 끌어 들였다. 러시아의 귀족과 백성들은 표트르 3세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품었다. 마침내 1762년 7월에 러시아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군이 표트르 3세를 폐위시켰다. 그들이 다음 황제 즉 차르로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표트르 3세의 아내인 예카테리나였다. 표트르 3세는 그로부터 8일 뒤 암살된다.

예카테리나는 원래 고귀한 이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당시 유럽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계몽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이전의 일 방향적인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를 반성하고 러시아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투지로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때때로 내놓는 대민 정책은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실행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그칠 뿐이었다. 예카테리나의 교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헌법은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헌법은 헌법을 제정했다는 의의만 남길 뿐, 사문화되었다. 예카테리나의 고귀한 이상에 비해 그녀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귀족들의 힘으로 차르에 오른 그녀는 불안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만 했다. 그녀가 귀족들에게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고귀한 이상과는 배치되는, 러시아 백성들에 대한 더 가혹한 착취의 권리였다. 견디지 못한 러시아 백성들이 봉기하여 푸가쵸프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카테리나가 선택한 것은 러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그녀의 친위 귀족들이었다. 그녀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농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그녀가 차르가 되기 전 꿈꾸었던 러시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그녀의 치세가 완전히 암흑의 시간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표트르 대제 이후 가장 부강한 러시아를 만든 인물이기는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 영토를 넓혔고 낙후되었던 러시아의 문화를 서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향상시켰다. 지금은 에르미타쥬 박물관이 된 겨울 궁전에 모인 미술품들은 모두 예카테리나의 치세 때 모은 것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러시아의 부강은 수 천만 러시아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고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권력에 파묻혀 있었다. 현재 예카테리나에게 붙여진 대제라는 칭호도 그녀가 외면하였던 러시아 백성들의 눈물 속에서 가능한 이름이었다.
'외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양여천 '무지막지한 여자' (1) | 2015.10.28 |
|---|---|
| 다카도 가나메 '갈색의 천사' (1) | 2015.10.28 |
| 해롤드 핀터 '밤 나들이' (1) | 2015.10.27 |
| 해롤드 핀터 '지하 아파트' (1) | 2015.10.27 |
| R. 타고르 '고행자' (1) | 201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