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중 도연은 장미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장미는 술집에 나가고 무능한 도연은 재능 없는 글만 써대고 있다. 한편 빚에 시달리는 연출가는 새로운 작품을 집필하고 있다. 그런 연출가에게 사채업자 방학수가 찾아온다.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방학수는 연출가가 집필하고 있는 연극에 투자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극작품에 대한 방학수의 노골적인 주문과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연출가는 자신도 모르게 방학수가 주문하는 대로 작품을 수정하기 시작 하는데…

<미친극>은 첫 장면으로 극작가 도연과 술집에 나가는 그의 아내 장미를 등장시켜 관객의 시선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등장인물 연출가의 희곡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밝혀지고 <미친극>은 극중 극의 형식을 띠며 작품의 풍성함을 더하여 간다. 연출가에게 받을 빚이 있는 사채업자 학수는 결국 사채 빚을 연출가의 희곡에 투자하는 명분으로 작품에 개입하게 되고 급기하 본인의 캐릭터를 닮은 인물을 작품 속에 출연 시킬 것을 종용하며 결국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간다. 극이 진행되면서 학수는 점점 희곡 속의 삶과 현실의 삶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경계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돈으로 상황은 절망에 치닫게 된다. <미친극>은 이렇듯 복잡한 희곡을 치밀한 구성을 통해 엮어낸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극작가이면서 신춘문예 시와 소설 부문으로 각각 등단한 바 있는 최치언의 독특한 이력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 최치언을 말하게 한다.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을 수상한 최치언은<코리아 환타지>,<연두식 사망사건>,<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마음>,<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언니들>등의 작품으로, 연출가와 관객 모두를 열광시키는 극작가로 급부상하였다.<미친극>은 여러 가지 문학 코드를 한데 엮어, 때로는 엉뚱하게 때로는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며 한바탕을 소란함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소란의 한가운데 있는 작가의 시선을 섬뜩하리만큼 날카롭게 느끼게 만드는 묘한 재미를 선사한다. 최치언의 천재적인 작가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의 역작 중 단연 돋보이는 희곡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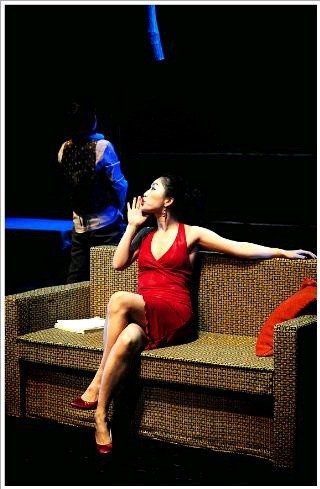
최치언 작「미친극」에서 외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마치 외젠 이오네스크가 쓴 일련의 부조리극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처럼 ‘착한 남자 방학수’라는 억압자 캐릭터가 연극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피억압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역전의 과정이다. 사채업자 방학수는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계약을 내세워 장미라는 여성 자체를 소유하려 하고, 그에 따라 장미에게 의존하고 있던 도연 역시 방학수의 권력에 예속된다. 장미-학수-도연의 삼각관계는 액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이야기 세계의 서사를 이루는 중심축이다. 반면 액자 바깥에는 이 이야기를 희곡으로 쓰고 있는 연출가와 그의 창작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사채업자 방학수의 또 다른 이야기 세계가 있다. 이 액자 바깥의 이야기에서도 방학수는 금권에 의한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며, 두 이야기 세계를 관통하면서도 동시에 두 세계를 매개해주는 방학수라는 인물이 원하는 것은 연극이라는 허구적인 세계를 설치하여 “해피엔딩”이라는 환상을 맛보는 것이다. 방학수에게 “해피엔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쳇바퀴 돌듯 고독과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는 부조리한 삶에 허구적으로나마 ‘엔딩’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앞서 결정되어 있는 구조의 힘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과도 같다. 그러나 연극이 진행될수록「미친극」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공은 방학수라는 인물이나 그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그 ‘구조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정확히 말하면 현실과 연극, 사실과 허구, 이성과 상상력의 불가분리성을 드러내는 더 넓은 차원에 있어서의 ‘구조’인 것이다. “거울과 거울을 서로 마주 세워놓듯” 현실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는 서로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증식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연극을 현실과 분리된 어떤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로 간주하고 연극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학수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더 커다란 절망에 맞닥뜨리게 된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액자 내의 이야기 세계와 액자 바깥의 이야기 세계는 계속해서 뒤섞인다.「미친극」의 무대에서 관객의 시각을 사로잡는 감/배나무라는 오브제는 이러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성과 한음의 일화로부터 빌려온 듯한 이 감/배나무라는 오브제는 경계선을 넘어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 세계로 뻗어 있으며, 그 자체의 현존으로 경계선이라는 인위적인 구분 자체를 무화시키기 때문에 “이 주먹이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제각기 인물들은 감나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배나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호명’ 자체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그 둘을 하나로 합쳐놓는 감/배나무의 상징력 앞에서 단지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나무를 뽑아버리려는 방학수도, 밑동에 오줌을 누면서 조롱하는 도연도 감/배나무가 상징하는「미친극」의 일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미친극」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브제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을 끊임없이 관객에게 주지시키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상자 속에 상자가 들어 있고 또 그 상자 속에는 다른 상자가 들어 있으며 (…) 가장 바깥의 상자가 닫히면, 모든 상자는 하나가 된다”라는 도연의 대사는 방학수의 운명을 예시해주는 것이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권총이라는 오브제는 허구, 환상, 상상력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개입하여 우리의 물리적인 실존 자체를 위협하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허구, 환상, 상상력을 도구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단지 이용해보려고 했던 방학수는 액자의 안과 밖을 이루는 이질적인 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자신이 ‘바깥’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의 힘 앞에 무력하게 놓여 있는 일개 개인임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본다면 「미친극」의 출발점은 “텍스트성”이며,「미친극」의 주제는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는 명제로 수렴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미친극」이라는 연극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명제에 따라 텍스트와 그 바깥, 공연과 그 바깥―무대와 객석이라는 두 영역을 허물고 해체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실제 공연에서 그 해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미친극」은 자신이 스스로 내세운 가설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관객이 그 해체를 ‘체험’하도록 만들려면 우선 연극은 관객 자신이 “내가 어떠한 구조들에 속해 있으며, 그 구조들이 실제로 내게 미치는 힘은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방학수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공감의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미친극」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해체의 경험이란 단지 지적인 분석의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의경 '신병후보생' (1) | 2015.11.11 |
|---|---|
| 차범석 '손탁호텔' (1) | 2015.11.11 |
| 최치언 '코리아 환타지' (1) | 2015.11.10 |
| 김경옥 '나는 정신대원이었다' (1) | 2015.11.10 |
| 이용준 '심판' (1) | 201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