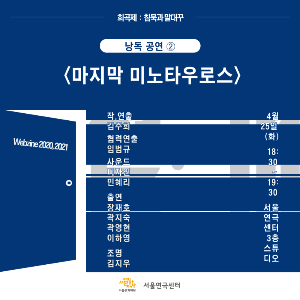
다시, 대멸종 이후,
살아남은 인간, 짐승,그리고 새끼
인간과 동물의 오랜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출구 없는 미궁과 같은 이것의 기원,
혹은 미래를 신화 속 미노타우로스를 통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짐승'과 '인간'은 서로 본인이 정답이라고 싸우며 열렬히 뒤엉킨다.
마지막 미노타우로스인 '새끼'는 끝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며
대답을 애타게 찾아다닌다.
왜 태어나야 하는지 말해줄 수 없는 채로
새끼를 낳을 수 없다며 절규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내 우울을 들여다 보다 보면 잡아 먹힐까 봐 두려워진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죽고 싶지 않은데 죽게 될까 봐 무서워진다.

"탄생과 죽음이 뒤섞이고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신은 가장 비참한 표정을 짓는다. 금기가 사라진 그곳은 세상의 끝이자
세상의 이전이다. < 마지막 미노타우로스 >는 크리처물의 오래된 클리셰를
비틀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참한 몸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 추천의 말 중 일부 발췌, 희곡운영단 김연재

<작가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김주희라고 합니다. 극작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도,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 대해 씁니다. 나와 당신 안에 파묻힌 목소리에 취약하고, 당신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에 의지하며 연극을 해요. 유해한 세계 속 그럼에도 눈동자가 맑게 빛나는 이들, 누군가의 손을 꾹 붙든 이들, 뒤돌아 우는 이들, 잠깐의 바람에도 생각에 잠겨 흔들리는 이들을 바라보려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느 때에 이 글을 읽으실까요. 저는 동터오는 새벽, 책상 앞에 있어요. 관광객처럼, 어두운 책상에 빛이 파고드는 순간을 관람해요. 책꽂이를 가득 메운 다이어리엔 스스로를 일으키려는 기록들이, 포스트잇에는 잊을까 봐 자꾸만 적어 두어서 자꾸만 느는 메모들이 담겨 있네요. 노트북 화면에는, 노란 폴더들이 언제고 들어갈 수 있는 집처럼 곳곳에 있어요. 왜인지 그 앞에서 자주 망설이지만요. 저는 <어느 날 문을 열고>(2022), <마르지 않는, 분명한, 묘연한>(2019), <낙원 (2019)> 등의 작품을 썼어요. 어떤 곳에서든, 어느 때든 당신과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우숙 '푸른 무덤의 숨결' (1) | 2026.01.24 |
|---|---|
| 신해연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냐' (1) | 2026.01.23 |
| 이수인 '유리 가가린' (2) | 2026.01.22 |
| 시민창작 뮤지컬 '어떤 여행' (2) | 2026.01.22 |
| 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 (2) |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