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단종의 재위시기. 장군 이징옥은 북방의 영토를 여진족으로부터 지킨다.
수양대군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반대파들을 제거한다.
그 중에는 이징옥이 모시던 김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진족은 자신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학문을 가르쳐준 이징옥에게 감화되어
땅을 바치고 황제에 오르라고 종용한다.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는
'마루치'가 주도적으로 부추긴다. 이징옥은 갈등한다.
그 와중에 한양에서 도승지와 후임 절제사가 도착한다.
수양대군은 이미 여러 번 자객을 보내 이징옥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징옥을 한양으로 불러와 제거할 속셈이었다.
이징옥을 죽이려는 도승지와 후임 절제사를 이징옥의 부하들이 제거한다.
마음 굳힌 이징옥은 황제에 오르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평안도로 진격한다.
평안도의 절제사인 정종은 이징옥의 군사를 당해낼 수 없겠다고 판단해
성문을 열고 이징옥을 맞이한다. 정종은 이징옥에게 높은 벼슬을 요구했으나
허황된 미래만 공상으로 확답하지 않는 이징옥에게 불안감을 느낀 정종은
이징옥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이징옥의 부관인 참장은 나라를
등지면서까지 장군을 모시지 않겠다며 정종과 손을 잡는다.
깊은 밤, 관군이 들이닥치고 성 곳곳에 불이 난다.
이징옥은 부하들을 시켜 관군을 물리치고 불을 끄게 한다.
자신을 경호하던 두 아들에게는 한양으로 상감을 모시러 갔던 마루치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켜달라며 보낸다. 혼란이 진압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징옥은 선조들에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이징옥 뒤에서 참장이 나타나고 참장은 이징옥을 칼로 벤다.
농악 소리와 사람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지며 막이 내린다.

극단 성좌의<검은새>는 여류 작가 정복근(鄭福根)의 여성답지 않은 감각의 결정체이다.
희곡으로 보았을 때 검은새의 비의(秘義)가 민족주의적인 전통의 한 변형으로서 이만큼 체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검은새의 무리와 연결된 이징옥의 반란과 대금국 건국의 배경에 짜여 들어간 수양대군의 쿠데타와 단종의 복위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얽어 맨 작가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로 꾸미면서 한 영웅의 의지와 행위를 역사적 사실에 결부시키기에 앞서 내면세계의 필연성으로 가져가는 척도의 확실성이다. 왜 이징옥은 실패했는가. 영웅의 우유부단은 성격적인 것인가, 심리적인 것인가. 작가는 이징옥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마루치를 그리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경우에 역사와 허구는 어떻게 극적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야기는 야담조로 흐르기 쉽다. 그런 흔적들이 마루치의<검은새>패들이 벌리는 사물놀이, 탈춤, 농악, 춤사위 등에서 엿보인다. 역사의 진행과 놀이전승의 이질적인 대조는 흥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실(史實)과 난장판의 놀이정신이 만주 벌판에 대한 실지회복이라는, 우리의 잠재된 통일의 염원을 대변할 때는 근거 없는 상상적 이미지가 설화세계의 색채를 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연출 권오일(權五鎰)은 무대를 보다 대담하게 환상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양식화된 무대 위에 올려진 인물들은 너무 리얼하고 한편 검은새의 무리들은 산만한 사물놀이패의 생경한 춤사위로 무대의 환상을 깬다. 이징옥과 마루치의 단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극적 진행은 너무나 성급하게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데 그 계기가 개인적인 것인가 숙명적인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고 작가나 연출가가 위서(僞書)에서 발견한 역사적 사실을 단(丹) 신드롬의 연장선에서 쉽게 단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게 한다. 희곡작품보다 무대는 훨씬 빈 것 같은 것이 음악이나 안무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허구의 안배 및 영웅의 행위에 대한 내면적 관조가 얕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작가의 말 ; 정복근 <시도와 결과에 대하여>
모 일간지에 한동안 연재되었던 <명무(名舞)>취재팀과 함께 몇 번인가 전국방방곡곡을 뒤지며 취재 여행을 한 일이 있다. 기왕에 몸에 익혔던 좋은 춤을 아무 것도 아닌 양 일상 속에 대강 대강 파묻어 놓고 지긋이 반평생 살아오신 노인들을 새삼스러운 간청, 권유로 일어나시게 하기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춤을 배워야만 했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겨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젊어서부터 다부지게 지켜왔던 예인의 긍지를 비참하게 영락한 현재의 생활 속에서도 피나게 지켜 새삼스러운 각광을 애써 외면하시는 어른이 있었고, 아들,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이름난 춤을 감추려고 아예 자신이 죽었다고 헛소문내고 숨어버린 분도 있었다. 그러나 좋으면 좋은 대로 궂으면 궂은대로 사연 많으신 어른들을 찾아내어 갖은 말로 권해서 한 번 일어나시게 하기만 하면 펼쳐드는 팔동작 하나 옮겨 딛는 발사위 하나로 눈앞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이로운 순간들이 보여지고는 했다. 살풀이 춤의 소박하고 유연한 움직임속에 감추어져 있는 절제된 힘의 무서운 응집, 농악놀음의 흥겨움속에 언뜻 언뜻 드러나 보이는 범상치 않은 위엄과 예기, 사물놀이패의 신들린 듯한 가락 저 뒤에서 아련히 떠올라 바람이 커튼을 흔들 듯 공기 자체를 뒤흔드는 신비롭고 기이한 함성같은 것들 앞에서 나는 매번 숨을 죽이곤 했다. 당장이라도 눈앞의 이 낯익고 태평한 공간이 찢어지고 겹쳐진 셀로판 종이를 통해서 보듯 백년, 천년, 수천년 전의 그 무엇인가가 눈앞에 가차없이 드러나 보일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모든 감동, 경험들이 일일이 다 작품 속에 고스란히 옮겨질 수야 없겠지만 이러한 느낌들 중의 한 조각만이라도 나는 작품 속에 깊이 깊이 밀어넣고 싶었다. 승자의 기록인 역사 속에 한낱 미미한 죄인으로 매장되어 버린 한 인물을 되살려 내고 그를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의 한 존재를 빚어내어 그들의 좌절과 패망에 일말의 희망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것도 결국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는 의도였을 뿐이어서 서툰 시도는 이제 연출, 연기, 스탭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문 결실을 맺을 지경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을 쓰도록 처음부터 내내 도와주고 지켜봐 주셨던 연상의 친구와 미련한 고집을 꺾도록 달래어 공연할 기회를 주신 권오일 선생님, 그리고 한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평론 ; 최완기(서울시립대학 교수)<국외자(局外者)의 울분>-
정사(正史)의 시각(視覺)에서 본 이징옥(李澄玉)
1453년 함길도 길주(吉洲)에서 대금황제(大金皇帝)를 칭하며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징옥(李澄玉)의 거사는,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창업하고서 최초로 당면한 지방민의 항거로서, 감히 황제(皇帝)를 칭하여 사대 사상(事大思想)에 젖어있던 당시의 중앙정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 지방의 민중운동에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란(反亂)으로 볼 수만은 없다. 즉 이징옥(李澄玉)의 거사는 당시의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한 대내적 측면, 그리고 국제 정세의 동향과 밀착된 대외적 측면의 두 가지 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열 네살 때 산돼지를 산채로 잡았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무용과 담력이 뛰어났던 이징옥(李澄玉)은 때마침 육진(六鎭)을 개척함에 진력함에 김종서(金宗瑞)에게 발탁되면서 국경개척에 공을 세우게 되고, 이로부터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고려말, 사회 혼란과 이민족(異民族)의 침입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건국된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안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를 추구하면서, 한편 밖으로 주변 민족과도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국력(國力)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조선왕조는 발해(渤海)가 망한 이후 우리 영토에서 제외된 옛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북방에 대한 개척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는 많은 야인(野人) 집단이 살면서 우리의 변경을 침략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야인(野人)에게 귀순을 장려하고, 국경무역을 허락하여 회유하는 한편, 강경책을 써서 대규모 정벌군을 파견하여 야인(野人)의 본거지를 소탕하였다. 그리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우리의 국경선으로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흔히 그 공로는 김종서(金宗瑞), 최윤덕(崔潤德)에게 돌려지고 있으나 두만강 유역에서의 실질적 선봉장은 이징옥(李澄玉)이었다. 이징옥(李澄玉)은 싸움에 있어서 백전백승(百戰百勝)이었다. 그 공로로 그는 함길도(咸吉道) 도절제사(都節制使), 즉 지금의 사단장급에 올랐다. 그는 야인사회에서 신화적 존재로 점차 부각되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武力)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야인(野人)의 생활 대책에도 유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편 이징옥(李澄玉)의 거사는 김종서(金宗瑞)의 정치노선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디 무장(武將)으로서 정치와 무관하였으나, 지위가 높아지면서 중앙의 정치동향과도 맥(脈)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정치실현은 세종(世宗)의 죽음과 더불어 왕권(王權)이 크게 악화되었다. 국경개척에 공을 세운 김종서(金宗瑞)등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갔으니, 이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왕권(王權)의 강화라는 명목에 이른바 '10월 거사'를 일으켜 김종서(金宗瑞)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중앙정계의 권력구조 개편과 아울러 군대의 지휘권도 개편되어 갔다.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서는 김종서(金宗瑞)의 심복이나 다름없는 이징옥(李澄玉)에게 군사권을 맡겨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김종서와 정치노선을 같이하던 이징옥은 아무런 과실도 없이 파직되었고, 그 소식조차도 수양대군이 새로이 파견한 박호문(朴好問)에게서 전해듣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찌보면 이징옥(李澄玉)의 움직임은 사육신사건(死六臣事件)과 더불어 단순히 수양대군의 집정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권(中央政權)에 대한 지방세력(地方勢力)의 항거였으며, 왕권(王權)에 대한 신권(臣勸)의 분쟁 또는 사대(事大)에 대한 자주(自主)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이후 자신의 정권에 도전한 세력이라면 내외불문하고 가차없이 제거하였으니 그것은 봉건적(封建的) 중세질서(中世秩序)의 강화라는 역사의 움직임을 더욱 고착시켜갔다. 이징옥(李澄玉)의 존재와 그의 거사는 이와같은 15세기 조선(朝鮮)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국외자(局外者)로 사라져 갔으나,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기에는 다소의 여운을 남겨준다. 역사(歷史)는 항상 승자(勝者)의 편에 서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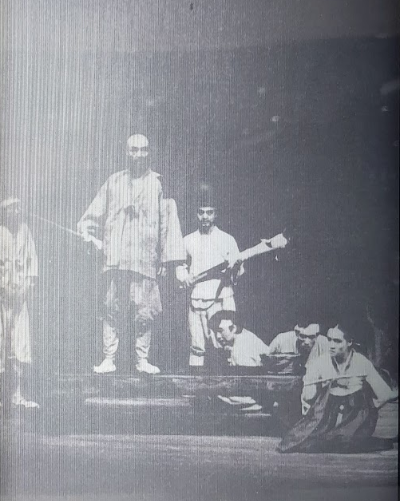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도경 '괴물' (1) | 2025.04.27 |
|---|---|
| 노경식 '강건너 너부실로' (2) | 2025.04.27 |
| 이언호 'Q요리, 그게 뭐지요' (9) | 2025.04.25 |
| 이원경 '수선화' (3) | 2025.04.25 |
| 이민우 '숲을 지키는 사람들' (1)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