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년 「신동아」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소설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다. 제목 속의 '삼포’는 가공의 지명이지만 떠도는 자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이 소설은 1973년 9월 「신동아」에 발표되었다가 1974년 창작과 비평사 낸 소설집 「객지」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부랑 노무자인 '영달'과 '정가. 눈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귀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도중에 술집 작부 '백화'를 만나 떠돌이로 살아가는 처지를 밝히며 삶의 밑바닥에 깔린 슬픔의 근원을 확인하게 되고, 세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 그토록 그리던 '정가의 고향’ 삼포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송두리 째 사라진 사실을 통하여 부랑 노무자의 비애가 밀도 있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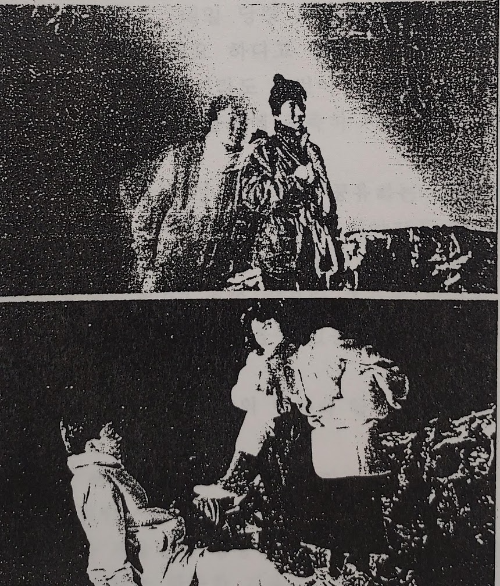
‘영달’은 부랑 노무자로 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인물이고, '정가' 는 옥살이를 하면서 목공· 용접 구두수선 등 여러가지 기술을 배웠으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 삼포를 찾아간다. 우연히 만나 동행이 된 '영달'과 '정가’가 술집에 들렀을 때, 주인은 '백화'란 작부를 찾아주면 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눈길에서 만난 '백화'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다. 그리고 백화를 도와 여비를 나누어 차표와 빵을 사준다. 감격한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고 그들 곁을 떠난다.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민은 뿌리를 잃고 도시의 밑바닥 생활을 하며 일용 노무자로 떠돈다. 이러한 상황의 황폐함과 궁핍함이 '영달'과 '정가’ 같은 부랑 노무자, 백화 같은 작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시대적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정氐에게는 이제 그 옛날의 아름다운 삼포(森 浦)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육지로 연결된 삼포는, 그가 떠나고자 했던 도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산업화된 공간으로 전략해 버린 것이다. 삼포는 그에게 있어 오랜 부랑 생활을 끝내고 안주할 수 있는 곳, 곧 정신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氏에게 있어서 삼포의 상실은 곧 정신적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며, 그 순간 '정씨'는 '영달’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랑자가 되고 만다.

연극 「삼포가는 길」(황석영 원작 최솔 대본)은 아름다운 무대의 서정시였다. 벽지 공사판, 밥집, 들판, 산길, 비각,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폐가, 눈길, 감천역 주변, 막노동꾼 영달, 공사판 인부 정가, 술집작부 백화 등의 사랑이야기, 고향이야기, 세상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삼포로 가고 있다. 그들은 슬프지만 체념하고 산다. 그들은 서로 다정하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준다. 작중 인물들의 정감의 표현이 뛰어난 무대였다. 무대 미술도 좋았고, 음향. 조명도 살아서 움직이는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이토록 격조 높은 무대를 꾸며낸 연출가 최솔의 연극적 상상력은 놀랍기만하다. 작중인물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파고들어 이들을 뚜렷한 성격의 인물로 창조하는 일은 또다른 차원의 작업일 것이다. 우리들 이웃들의 애환이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스케치 되고 있었다. 무대가 안정되고 있었다. 정가 역의 최균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억제되고 정확했다. 삼포가 무엇이길래 그 곳에 희망을 걸고 떠나는 인간의 좌절과 희망이 그의 몸에서 물씬 풍겼다.
(이태주. 연극평론가)

'풀뿌리 인생' 진솔하게 묘사한 고향 잃은 사람들의 사연이 이 작품이다. 이렇게 짧은 단편 속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소설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다시 황석영을 주제로 소설을 말해 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 않았으랴만 90년대 소설을 반성적으로 보려는 기운이 부쩍 커진 지금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그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혹자들은 중편 ‘객지'가 아니라 단편 '삼포가는 길’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간 소설에서의 리얼리즘의 실천이 문학성을 구축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삼포가는 길’ 이야말로 문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작품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리라. 과연 그러한 지도 모른다. 이 글에 대한 의뢰가 있기 얼마 전 황석영의 선집을 다시금 일독하는 가운데 그의 창작론을 접해볼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 그는 “될 수만 있으면 주관적인 작가의 의식을 애써 배제하려 한다. 형용사를 줄인다. 감정을 절제 하노라면 자연히 문장은 삭막하고 건조하게 된다"고 쓰고 있었다. ‘삼포가는 길'이 바로 그렇다. 독자들은 거기서 문장을 아껴 쓰는, 그리하여 절제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남쪽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길과 오탁의 세상에 한없이 내리는 눈발을 보여주는, 도도하고 담담한 작가를 만난다. 거기 고향을 잃어버린 뜨내기 인생들, 영달과 정씨와 백화의 표정이며 말씨며 몸짓 따위는 또 얼마나 함축적인가. 영달과 정씨가 세상살이, 객지살이에 지쳐 고향을 찾아가고 몸 의탁할 일터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삼포는 이미 옛 삼포가 아니라는 결말 앞에서 독자들은 작부살이에 지친 백화의 또다른 고향에 대해서도 처연한 심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다. 또 비옥한 땅은 남아돌아가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다는 옛 삼포와, 그곳을 향해 눈길을 걸어가는 영달과 정씨의 여정과, 세상을 덮어 무진장 내리는 한겨울의 눈과, 행간 곳곳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백화이며 정씨이며 영달의 사연이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가. 요컨대 황석영과 그 중에서도 지금 특히 삼포가는 길에 대해서 새롭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감추어진 일들을 세상 위에, 독자 앞에 드러내는 작가의 빼어난 솜씨 때문이다. 이 짧은 단편을 읽고 난 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했던 사연들을 아는 이들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삼포가는 길'이라는, 그 흰빛의, 상징의 세계가 바로 현실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삼포가는 길은 깨우쳐 준다. 리얼리즘이란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주는 것임을. 황석영을 다시 읽을 때가 온 것이다. (문학평론가 / 방민호)

'한국희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영무 '거슬러 부는 바람' (1) | 2023.06.25 |
|---|---|
| 손정우 '다림질 하는 사람' (1) | 2023.06.24 |
| 김홍신 원작 하유상 극본 '인간시장' (작은 악마) (1) | 2023.06.22 |
| 김정숙 '소녀' (1) | 2023.06.21 |
| 강은경 'Happy Birthday Two' (1) | 2023.06.20 |